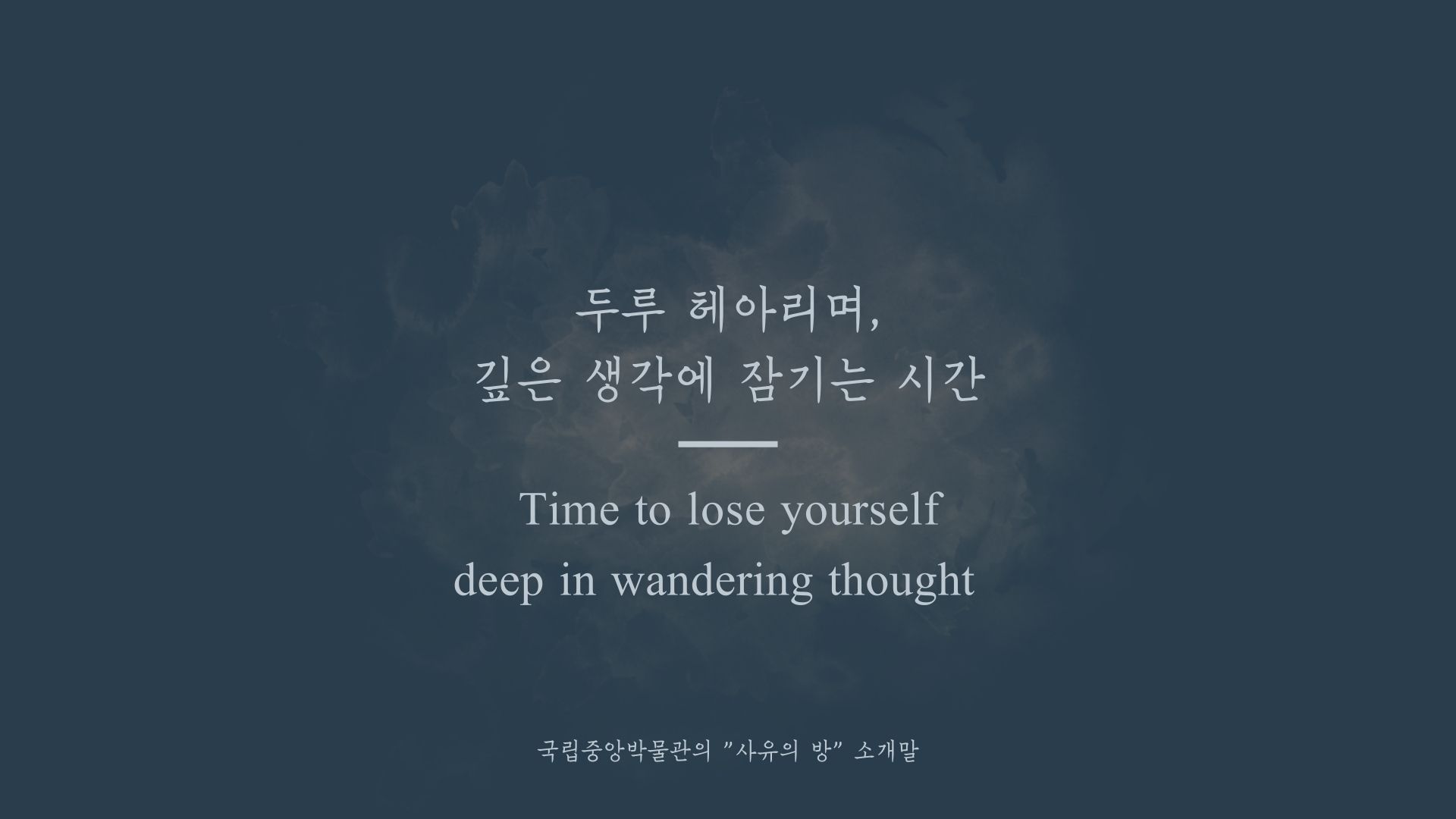‘사유의 방’으로
지난 포스팅 말미에 포용과 교감의 디자인사례를 다루기로 하였다.
그 곳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박물관 2층에 가면 국보 문화재인 반가사유상 두 점을 전시한 공간이 있다.
‘사유의 방’이다. 건축가 최욱(원오원아키텍스 대표)이 설계한 공간이다. 건축가는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공간이 일체화된 느낌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소극장 규모로 전시실을 설계하였다” 한다. 그리고 “관람객은 어둠을 통과하는 진입로,미세하게 기울어진 벽과 바닥, 반짝이는 천정 등 추상적이고 고요한 전시 공간에서 반가사유상을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라 안내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페이지https://www.museum.go.kr/site/main/showroom/list/631120)

‘포용과 교감’ 속으로
‘사유의 방’의 이란 전시실 브랜드 네이밍은 건축가 최욱의 소개로 김아린(비마이게스트 대표)이 만들었다.
(관련기사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1/26/VLSXHFMXBJGWLHEFUFEG6PK77I/)
공간 설계와 브랜딩의 조화가 뛰어나다. 정말이지 포용과 교감에 대한 사례로 소개하기 완벽하다. 건축가와 브랜딩전문가의 높은 식견에 감탄한다. 건축가와 브랜딩전문가, 그리고 박물관측의 완벽한 협업을 보여준다. 서로에 대한 리스펙 스피릿팀워크는 하나가 아닌 다양성의 공존이다. 이 공간에서 느껴진다.
전시장 내부에는 어떤 설명도 있지 않다. 들어가기 전 입구의 짧은 소개말과 전시실명의 문구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반가사유상이 지닌 기운을 오롯이 집중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다른 부차적인 설명과 해석이 없어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방해가 되리라. 창작자들이 의도한데로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공간이 일체화 됨을 경험하게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은 자연스레 불상을 향하고 있다. 주변의 벽은 모자람도 과함도 없이 적당한 시야를 유지해준다. 분명 실내 공간이지만 답답함이 없다. 벽의 작은 기울임과 흙 빛의 조화는 외부 인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천장도 막혀 있으나 중정에서 바라보는 밤 하늘의 차경 같다.
몇 걸음을 옮기고 나면 반가사유상을 마주하게 된다. 작은 단상 위에 두 반가사유상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반가운 마음에 말을 하려다 자연스레 생각에 잠긴다. 질문이 아니라 자문이었다. 나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것이다. 오묘한 미소의 뜻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사실 나의 짧은 글로는 공간의 경험을 형용할 수 없다. 느끼는 감정의 유영도 모두 다름일 것이다. 직접 방문하여 자신만의 초월적 경험을 가져보도록 하자.

공간의 숨은 입면 찾기
건축에서는 외부의 모습을 입면이라 한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인상과도 같다. 입면은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이다. 건축물이 주위 환경과 얼마나 어울리는지는 입면을 보고 알 수 있다. 건축가가 의도하는 설계의 컨셉도 입면을 통해 표현된다. 외형의 선, 층의 높이, 창의 크기, 외부 소재 등이 컨셉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이다.

입면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사유의 방을 해석해 보았다. 공간 디자인에도 숨은 입면이 있을까? 어떤 입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건축가는 벽과 바닥에 왜 기울기를 주었을까? 나름의 설계 의도를 상상해보았다.



| 건축가는 보이지 않는 입면을 찾아 냈다. 공간 안에는 숨은 입면이 있다. 전시물을 바라보는 시점의 프레임이다. 반가사유상을 바라보는 관람객에게는 암묵적 사각 프레임이 형성된다. 보통 사각 프레임은 그 안의 대상에 집중하게 유도한다. 수직 수평 구도의 투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관람객의 집중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유의 방은 달라야 한다. 작품에 집중하되 주변을 둘러보게 해야 한다.”
사유의 방은 수직수평의 집중과는 다른 시선의 방향을 유도한다. 사각 프레임의 입면을 활용했다면 전시물은 무형의 액자 속에 갇히게 된다. 반가사유상은 주위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반가사유상은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방식을 거부하리다. 건축가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관람객에게 반가사유상을 잠시 바라 보고 사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다. 그것이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공간이 일체화된 느낌” 이다. 일체화된 느낌은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 또한 있음을 알려준다. 결국 사유는 자신의 몫임을 깨닫는다.
바닥의 기울기는 작품으로 이끌어 준다. 벽의 기울기는 시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반가사유상의 가치를 느끼는 진정한 공간 경험을 벽과 바닥의 기울기로 표현하였다. |
공간을 경험하고 느낀 감상평이다. 상상이 틀린다 한들 어떻겠나. 공간디자인을 경험하면서 창작자의 의도를 살펴보자.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좋지만 가끔은 내재된 가치도 들여다보자. 이 또한 자신만의 프레임과 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프레임워크_Framework의 정체를 알자!!이다.